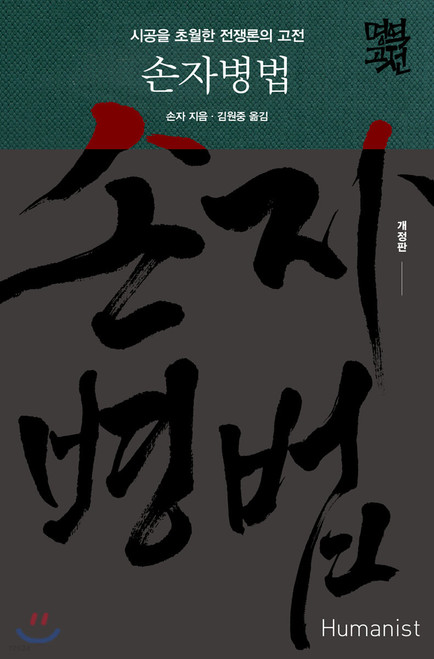Product Overview
성리학의 창시자 주희는 공자로부터 비롯한 유가의 도통이 증자, 자사, 맹자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들의 사상은 유가의 정통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동아시아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공자의 《논어(論語)》, 맹자의 《맹자(孟子)》, 증자의 《대학(大學)》, 자사의 《중용(中庸)》이 ‘사서(四書)’로 불리며 조선 및 동아시아 정치·사회·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경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맹자는 공자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유가 사상가로 꼽히는 위대한 인물이다. 유가 사상을 ‘공맹사상’이라 부르고, 그를 ‘공자 다음가는 성인’이라며 아성(亞聖)이라 일컫는 등 맹자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무수히 많다.
일반인에게는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나 인간은 누구나 측은해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성선설(性善說)’로 널리 알려졌지만, 사상사의 측면에서 맹자의 위치는 이보다 훨씬 높다. 맹자는 단순히 공자를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사상을 재해석하여 유가의 학문 체계를 확장했으며, 왕도정치·역성혁명·측은지심·호연지기·여민동락 등 다양한 정치적·도덕적 개념을 만들었다. 또한 그는 양주나 묵적 등의 사상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비판했으니, 동아시아 사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맹자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맹자는 공자의 위대한 면모를 되새기면서 자신이 성인 공자의 문하로서 학문을 익힌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성인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의 큰 세계를 보았으니, 본인의 시야 확장은 공자의 공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맹자의 사상은 공자의 사상을 사숙했고, 스스로 계승자로서 자부한 것은 사마천의 지적대로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배워 도통을 이었다는 것이겠지만, 여기에는 차별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즉 맹자는 공자의 인성론과 교육관을 재해석하면서 천명과 역사에 대한 자신의 사상 체계를 확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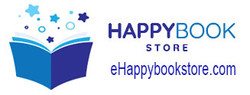



![사람을 얻는 지혜 [스페인어 완역본] The Pocket Oracle and Art of Prudence 사람을 얻는 지혜 [스페인어 완역본] The Pocket Oracle and Art of Prudence](https://cdn11.bigcommerce.com/s-6r7pgwu3ae/images/stencil/500x659/products/2583/3183/XL__07976.1723923622.jpg?c=1)